<똥의 인문학> 독서 일기 #2 - 타액의 공유부터 나의 결핍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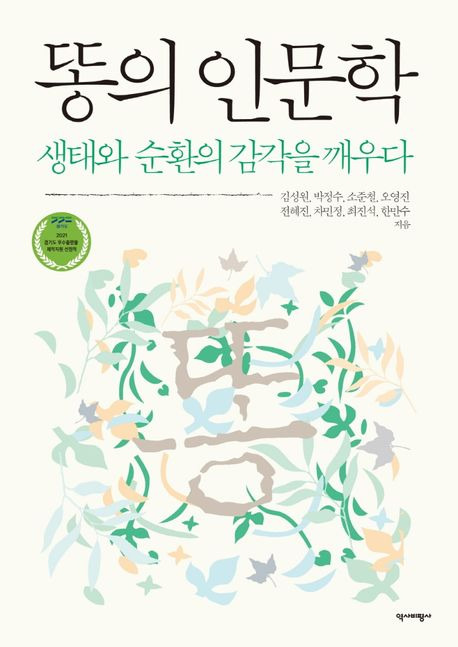
1. 타액의 공유와 공동체성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 마스크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이 실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서로 공기를 공유하고, 또 서로 침을 튀어가며 말하는 동안 체액을 공유한다. 그러면서 타인이 나의 일부가 되고 내가 타인의 일부가 되는 친밀함이 형성되는 것이다. 마스크 한 겹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만들어내는 정서적 거리감은 물리적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상상이었다. <똥의 인문학>에서 비슷한(하지만 훨씬 깊이 있고 학술적인) 구절을 읽고 무척 반가웠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과 소통할 때 분비물의 교환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쩌면 해로울지도 모를 분비물을 기꺼이 감수하는 과감한 도약을 전제로 한다. (중략) 외부 세계와의 공유란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일부 내어주고, 타인의 지저분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다.
- <똥의 인문학> 4장 '더러운 똥, 즐거운 똥, 이상한 똥'에서 발췌
마스크 한 겹에 대한 통찰보다는 가까운 과거의 일이다. 아직까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크던 시기였고, 요리 동아리 학생들과 화채를 만들어 먹은 날이었다. 완성된 화채가 담긴 커다란 냄비 주변에 아이들이 모여들어 수저로 다 함께 퍼먹으려는 모습을 보고 질겁을 했다. 덜어서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아이들은 작은 국그릇에 화채를 덜어내더니, 이내 수저를 국그릇에 함께 담갔다 뺐다 해가며 화채와 타액을 공유했다. (지도교사의 부주의로 인해 집단 코로나 감염을 일으켰다고 민원이 제기될 것만 같아 며칠은 정말 조마조마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학교 아이들(과 또 교직원 사이)의 공동체 의식이 타학교에 비해 강한 것은 음식을 공유하는 문화에서 나오는 것 같다.
2. 똥과 카타르시스
나는 똥 이야기를 좋아한다. 초등학교 시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불암 시리즈는 똥 이야기였다.
예쁜 아가씨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최불암 씨가 방귀를 뀌었다. 뽕. 그런데 아가씨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최불암 씨가 또 한 번 방귀를 뀌었다. 뽀옹.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방귀를 뀌어도 반응이 없던 아가씨가 보다 못해 최불암 씨에게 다음과 같이 쏘아붙였다.
"아예 똥을 싸라 싸."
(그 시절에는 이 농담이 왜 그리도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다.)
한편 초등학교 시절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티비를 보며 웃다가 남몰래 좋아하던 친구 오빠가 다 들릴 정도로 방귀를 뀐 일이며, 고등학교 시절 수업을 진행하시던 가녀린 여선생님께서 방귀를 뀌시고는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신 일이며, 어디서 얻어 온 거품 입욕제를 아이들 목욕탕에 풀어줬는데 무섭다고 울던 작은 아이가 욕조에 응가를 하는 바람에 거품 목욕이 5분 만에 끝나버린 이야기는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웃는 소재이다. 전혜진은 <똥의 인문학> 4장에서 프로이트가 초기에 활용한 카타르시스 요법과 관련하여, 똥에 대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행위야말로 '정서적 배설'과 '생리학적 배설'을 동시에 하는 최고의 정신요법이라고 주장한다.
3. 아이의 첫 선물 - 똥
프로이트는 아이의 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똥은 아이가 최초로 생산한 산물이자 몸의 일부로서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는 구체적인 성과물이다. 그리하여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똥은 아이에게 나르시시즘적 대상이자 세상에 내놓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지그문트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재인용
이는 나도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어 느날 아이가 응가가 마렵다고 말을 했다. 황급히 배변훈련용 변기에 앉혔고,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기저귀가 아닌 변기에 똥을 누었다. 똥과 엄마 얼굴을 번갈아가며 들여다 보는 아이의 표정에는 큰 성취감이 깃들어 있었고, 나는 탄성을 지르며 예쁘고 귀여운 똥 사진을 찍어 주변에 퍼날랐다.
한편 화장실 가기를 참으며 PeePee dance를 추던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나의 결핍에 대해 사유한다. 남동생이 태어나 외할머니댁, 이모댁, 할머니댁 등 일가 친척 집에 맡겨졌던 시절, (<맡겨진 소녀>가 내 이야기이도 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화장실에 대한 나의 두려움의 원인은 경북 영천 친할머니댁 푸세식 변기 자체였을 수도 있지만, 버림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는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서도 버리지 못한 오줌 참는 버릇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혼이 날 때마다, 어쩌면 나는 내 존재에 대해 점점 더 자신이 없어졌었는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났었는지 조금 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