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절망 사이 (feat. 죽음의 수용소에서)
출근길에 등굣길의 아이들을 관찰하며 깨달은 사실이다.
7시 55분쯤 약간 여유 있게 교실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 시각에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뛴다. 조금만 달리면 시작종 이전에 교실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7시 58분 전후의, 늦을 것이 확실한 시각에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들은 뛰지 않는다. 지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없기에, 뛰기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 죽도록 뛰어서 20초 늦으나, 걸어서 2분 늦으나 지각 처리가 되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에는 삶에의 희망을 잃은, 그래서 곧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을 두려워했다. 대체로 이런 현상은 아침에 수감자가 옷 입고 세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연병장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간청과 주먹질, 위협도 효과가 없다. 그냥 누워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중략) 그냥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가 싼 배설물 위에 그냥 그렇게 누워 있으려고만 한다.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더 이상 간섭받지 않고.
-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p.120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어차피 죽게 될 것이므로 세수하거나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부질없다고 여겨지는 상태는, 생에의 의지를 아주 놓아버린 절망적인 상태이다. 한편, 다시금 몸을 일으켜 연병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몸과 마음의 힘이 거의 바닥나다시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기도모임에 갔다.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못나도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려 분투하는 모습이고 싶다. 괴로운 와중에도 나의 꿈이며, 소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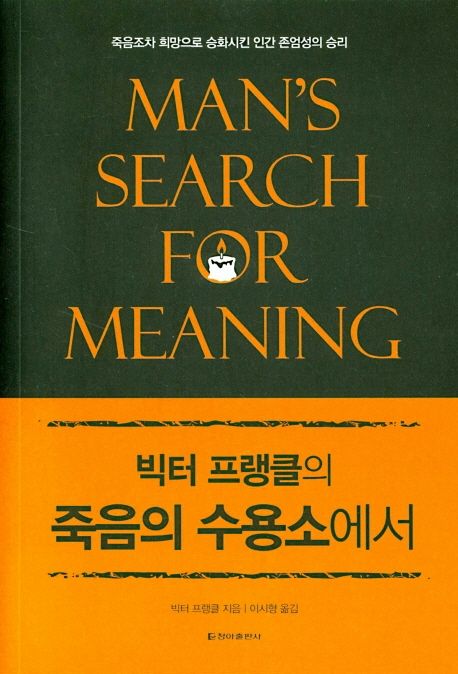
한편 꿈을 꾸는 행위에 대해 빅터 프랭클은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잠을 자면서 몸부림치는 걸 보니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분명했다. (중략) 그러다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놀라면서 그를 깨우려던 손을 거두었다. 그 순간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나쁜 꿈일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용소의 현실만큼이나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 같은 책 p.59에서 발췌
학생들에게도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 너무 괴롭고 참담한 순간들의 연속일지라도,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금 삶을 부여잡을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