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강도들도 자기들끼리는 이른바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기독교의 '형제애'와 자비에 근거한 인간관계의 확립을 제안'한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합니다. 아무리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일지라도 동료애와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작금의 사태를 보며 이해관계에 의해 진실을 감추고 불의를 두둔하는 왜곡된 '이웃사랑'에 대해 같은 예시를 인용하고 싶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안의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강도들의 이웃사랑'이 거국적으로 넓어지면 '사회 통합'이 가능해질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확장되면 '인류애'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리나 허츠의 <고립의 시대>에서 발견한 몇몇 가능성을 교육현장에 도입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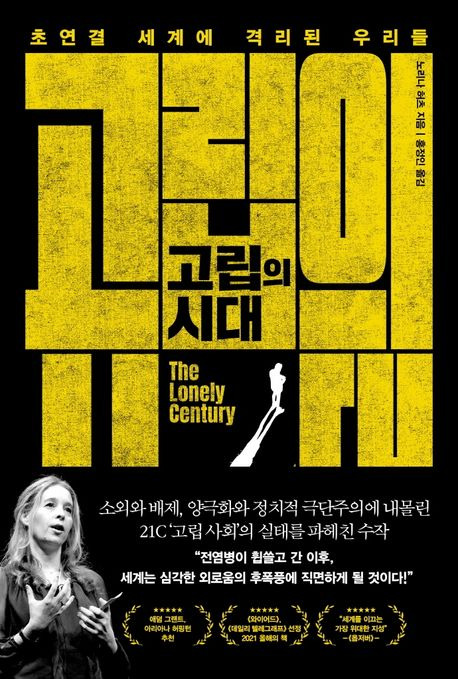
1. '일상적 면대면 상호작용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잘 보게 만든다'
노리나 허츠에 따르면 면대면 상호작용을 할 때 사람들이 서로의 공통점을 더 잘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통점에 비해 차이점을 더 쉽게 찾아낸다고 합니다.(김용규의 <생각의 시대>에서 읽은 내용인지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외 <생각의 탄생>에서 읽은 내용인지 헷갈립니다.)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지적 노력, 즉 고차원적 사고를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선상으로, 혹은 사이버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보다 면대면 상호작용을 할 때 고차원적 사고력을 가동하여 서로의 공통된 의견, 특징 등을 찾아내기가 더 쉬워지는가 보군요! 공통점을 찾기 쉬워지면 상대방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고요. 그러고 보니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 의사결정에 따른 주체의식이나 책임감, 인지적 공감 여부 등을 관장하는 두뇌 부분인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에밀리 A. 캐스파가 <명령에 따랐을 뿐?!>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교 교실에 이를 적용한다면,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눈을 보고 소통할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예방, 마약 및 흡연 예방 교육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기교육을 방송 송출을 통해서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교실 안에서 면대면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확보의 문제 등으로 강사를 여러 분 섭외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 강사단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중앙 방송을 통해 교육이 운영되는 중에도 각 학급에서 임장하는 교사가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교육 내용에 대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미국 아이비리그에서는 면대면 대화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표정 읽는 방법'이라는 수업을 개설했다'
전화 공포증, 혹은 콜 포비아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지요? 통화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요청을 할 때에도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전화를, 전화보다는 메시지 전송을 선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요. 시간도 절약되고, 간편하고, 얼굴을 마주 대할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서만이 상대방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읽으며 '진짜 소통'을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봉쇄된' 우리들은 소통을 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잘 못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안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소통의 위기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 미국의 어느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표정 읽기' 보충 수업을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학교 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노리나 허츠는 밝힙니다.(지난 글에서 출처를 기억하지 못했던 책이 바로 <고립의 시대>였네요.)
한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스마트폰을 탁자에 올려 두거나 심지어 그저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에도 상대방은 대화 당사자와 '덜 가깝고 덜 공감하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듣고 있을 때 휴대기기를 가방 속에 넣거나 자율 반납함에 넣도록 하여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회의 및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불허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것에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자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만 해도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없으면 수업 준비도 업무도 할 수 없으니까요.) 유럽과 동일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만큼은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이 '디지털 세대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신체 활동을 통한 학습이 인지과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접하고 이에 대한 학교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적어보고 싶었는데 다음 글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연대하는 법을 익히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글을 맺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사의 학생 살인 사건을 둘러싼 반응을 통해 생각해 보는 언론의 역할 (16) | 2025.02.11 |
|---|---|
| 교실 공간 배치가 의사소통과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7) | 2025.02.11 |
| 에밀리 A. 캐스파 <명령에 따랐을 뿐!?> 독서 일기 #2 - 공감 교육의 가능성 (11) | 2025.01.24 |
| 한국 사회의 갈등을 봉합합시다 #3 -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6) | 2025.01.17 |
| 조지프 르두 <불안>을 읽으며 사회정서학습의 의미를 고민하다 (11) | 2025.01.13 |